
나는 모국어인 한글로 작업하는 사람이다. 때로는 자음과 모음이 생명력 있는 나무처럼 뻗어 나오고, 문득 그 작은 글자들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발견하기도 한다. 인공지능은 아마 그 형태를 정교하게 모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를 써 내려가기까지 내가 지나온 수많은 계절의 풍경, 문득 가슴 한켠에 스며들었던 울컥이는 감정의 깊이까지 감히 흉내 낼 수는 없을 것이다.
예술의 본질은 결국 ‘느낌’에 닿아있다. 차가운 알고리즘으로는 결코 학습할 수 없는, 뜨거운 심장에서 솟아나는 고유한 감정의 영역이다. 한글의 부드러운 곡선 하나에 담긴 은은한 숨결, ‘ㅎ’이라는 텅 빈 듯한 글자 속에 배어 있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지한다. 그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기호가 아닌, 오랜 시간 우리 민족의 정서와 숨결이 녹아든 살아있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초기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종이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는 여전히 손으로 쓴 편지의 온기를 그리워하고, 디지털 화면 너머의 활자보다는 인쇄된 책의 질감을 더 친숙하게 느낀다. 오히려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아날로그적 감성에 대한 갈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인공지능 시대 역시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이제 예술가의 역할은 끝났다”는 냉소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첨단 기술이 발전할수록, 진정한 감정과 인간의 영혼을 담아내는 예술의 가치는 더욱 절실해질 것이라고. 기계는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술가만이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눈부시게 발전할수록, 인간 고유의 감성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예술가의 존재는 더욱 빛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되묻고 싶다.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예술가가 더욱 필요한 것은 아닐까?”
나는 ‘느림’의 소중한 가치를 믿는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지만, 예술은 천천히 무르익는 탐스러운 열매와 같다. 한 글자, 한 획을 정성껏 그릴 때마다 마음속에는 잔잔한 파문이 일어난다. 그 미세한 떨림이야말로,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인공지능 시대, 예술가는 낡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것이다. 아무리 정교한 기계라 할지라도, 내가 온몸으로 경험한 삶의 흔적, 뜨겁게 사랑했던 순간의 기억, 뼈저리게 슬픔을 느꼈던 날들의 조각들은 오직 나만의 고유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는 한글이라는 따뜻한 숨결과 함께 붓을 든다. 그리고 조용히, 나만의 이야기를 종이 위에 써 내려간다. 이 작은 움직임이 부디,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어 닿기를 소리 없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포토] 동포사회 최대 축제 15회 한국문화의날 (1)](https://bomdianews.com.br/wp-content/uploads/2022/08/한국문화의날IMG_7780-360x18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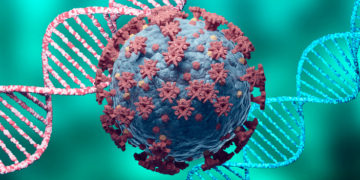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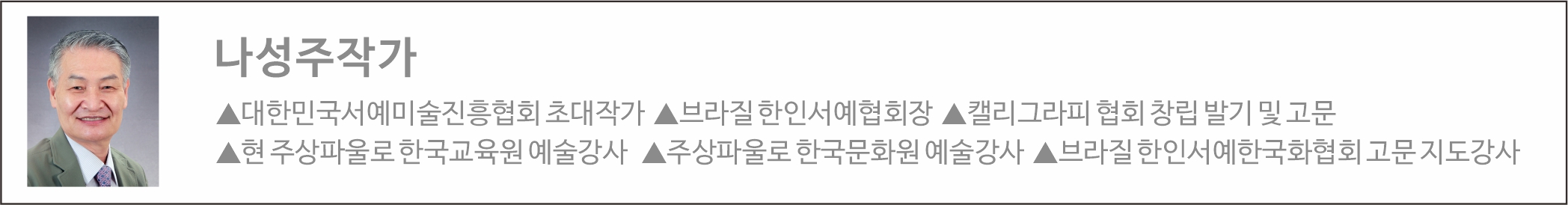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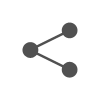
![[나성주칼럼] 심었다, 가꿨다, 이제 피워낼 차례다 – 브라질 땅에서 피워 올리는 한글의 향기](https://bomdianews.com.br/wp-content/uploads/2025/06/KakaoTalk_20250531_040943391-350x250.png)
![[나성주칼럼]한글을 심는 농부, 예술의 밭을 일구다](https://bomdianews.com.br/wp-content/uploads/2025/05/KakaoTalk_20250519_085542287-350x250.jpg)
![[칼럼] 라틴 아메리카 최대 시장 브라질, 배달 플랫폼 ‘쩐의 전쟁터’로](https://bomdianews.com.br/wp-content/uploads/2025/05/20250515_094339-350x250.png)








Este site é realmente fascinate. Sempre que acesso eu encontro coisas diferentes Você também pode acessar o nosso site e descobrir detalhes! Conteúdo exclusivo. Venha descobrir mais agora! 🙂
demais este conteúdo. Gostei muito. Aproveitem e vejam este site. informações, novidades e muito mais. Não deixem de acessar para se informar mais. Obrigado a todos e até mais. 🙂